최찬식 신소설 『추월색(秋月色)』

신소설작가 최찬식(崔瓚植. 1881∼1951)의 대표적 신소설로 1912년 [회동서관]에서 간행되었다. 이 장편은 당시의 신소설 중에서 가장 널리 애독된 작품의 하나로서, 1918년 3월에는 신극단 [취성좌(聚星座)]의 첫 공연작품으로 [단성사(團成社)]에서 공연하기도 하였다.
이 작품은 개화기 부산 지역을 배경으로 작품의 무대를 한국, 일본, 중국, 영국 등 광범위한 지역으로 펼쳐진다. 갑오경장 이후의 부패한 관료정치에 대한 민중의 반항을 나타내어 시대의식을 반영하면서 기구한 남녀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를 생생하게 묘사해 나간다. 이러한 작품의 문체는 당대 독자들에게 크게 환영을 받으면서 1921년까지 15판이나 거듭 찍는 인기를 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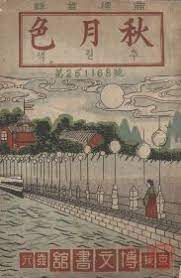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이시종의 외딸 정임과 옆집에 사는 김 승지의 외아들 영창은, 어릴 때부터 다정한 사이로 장차 결혼할 것을 약속한 사이다. 그런데 영창이 열 살 되던 해 김 승지가 초산 군수가 되자, 민란(民亂)이 일어나 김 승지의 집안은 역경에 처하게 된다. 난민(亂民)들은 김 승지 내외를 뒤주 속에 가둔 채 압록강에 버린다. 영창이 부모를 찾아 강을 따라 헤매다가 쓰러졌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던 영국 사람 스미스 박사가 영창을 구해서 본국에 데려가 공부시킨다.
한편, 이시종은 민란이 일어난 후 초산지방으로 가 보았으나, 김 승지 일가의 행방을 찾을 길이 없었다. 정임의 부모는 자기 딸과 영창과의 결혼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정임의 나이 열다섯이 되자 다른 데다 혼처를 정해 결혼시키려 한다. 그러나 정임은 이미 영창과 결혼키로 약속한 몸으로 두 남자를 섬길 수 없다고 버틴다. 계속되는 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마침내 정임은 집을 떠난 후 갖은 고생 끝에 일본으로 건너가 여자대학에 입학, 음악을 전공하여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다.
그런데 평소 정임에게 마음을 두었던 강한영이 유학생을 가장하고 정임에게 접근한다. 어느 날 강한영이 누에노 공원에서 정임에게 난행을 범하려 할 때, 공교롭게도 영국에서 귀국하여 이 공원을 지나던 영창이 그녀를 구하나, 살인 미수범으로 재판을 받는다. 결과는 영창이 무죄 석방되고 두 사람은 극적으로 재회하게 된다. 마침내 그들은 신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차 만주에 갔다가 한 청국인에게 체포되어 어느 집에 끌려갔는데, 거기서 우연히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영창의 부모를 만나게 되어 행복하게 살게 된다.

이 신소설은 갑오경장 이후 개화기 남녀 간의 사랑을 소재로 삼각관계를 그리면서 사랑에 따르는 모럴을 대조시킨 작품이다. 생생한 장면묘사와 남녀 주인공의 기구한 애정 이야기는 당시 신소설 중 가장 널리 애독된 작품 중의 하나이다. 갑오경장 이후의 부패한 관료정치에 대한 민중의 반항을 나타내어 시대 의식을 반영한 점, 장면의 생생한 묘사 그리고 기구한 애정 이야기는 당시 독자에게 환영받는 요소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최찬식의 소설은 식민지 사회의 현실과 단절된 의식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 등장인물들은 신분 상승에 의한 행복만을 추구하는 폐쇄적이고 특권적인 욕망 구조를 보여 준다. 이 작품은 재래의 신분 질서에 따른 결혼을 거부하고, 서로 애정과 상대방의 학식을 중시하는 신결혼관을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재래의 윤리관에 묶여 있는 구성상의 모순을 보이고 있다.
「추월색」은 무대가 한국ㆍ일본ㆍ영국ㆍ중국에 걸쳐 광범위하고, 새로운 애정윤리ㆍ신교육사상ㆍ 민중의 반항 등을 내세워 시대의식을 반영하면서 생생한 장면묘사로 기구한 남녀의 사랑을 전개시켜 나간 점이 당시 독자의 호평을 받았다.
♣
『추월색』은 주제의 방향을 신교육관ㆍ신혼인관에 역점을 두고 있다. 부패한 관료에 대한 민중의 봉기가 사건 전개과정에 삽입되어 당대 현실의 단면을 반영하기도 한다. 젊은이들이 일본ㆍ영국 등 선진국에 유학하여 새 지식을 얻고, 특히 신교육을 받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는 점 등에서 신교육관이 드러난다.
또한 어릴 때 친구이자 정혼자로서 당사자들이 성장한 뒤 다시 독자적인 의사로 혼인을 결정하는 신ㆍ구 절충적인 모습에서 새로운 혼인관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작품의 절충적 요소는 표면 주제와 이면 주제의 괴리를 일으키는 고전소설의 계승 양상으로 비판되기도 한다. 이 작품은 신소설 작품 중에서도 가장 많이 판을 거듭한 작품의 하나이다. 오랫동안 많은 독자에 의하여 애독되었으며, 개화기 애정소설의 본보기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나운규 시나리오 『아리랑』 (0) | 2023.07.24 |
|---|---|
| '아내'의 어원 (0) | 2023.07.21 |
| 이해조 신소설 『구마검(驅魔劍)』 (0) | 2023.07.19 |
| 이상협 번안소설 『해왕성(海王星)』 (0) | 2023.07.18 |
| 안국선 신소설 『금수회의록(禽獸會議錄)』 (0) | 2023.07.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