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원 중편소설 『무사(武士)와 악사(樂士)』
홍성원 중편소설 『무사(武士)와 악사(樂士)』

홍성원(洪盛原. 1937∼2008)의 중편소설로 1976년 [한국문학]에 발표되었다. 일제 말엽에서 자유당 독재의 1950년대까지를 배경으로, 김기범이라는 인물이 벌이는 우스꽝스럽고 기이한 행적이 그려진다. 그의 친구인 노년의 화가(畵家) 정동근의 회상으로 그의 행적이 서술되며, 추리 소설적인 기법이 가미되어 있다.
이 소설은 1970년대 서울과 전라도 K군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소설에 투영되어 나타나는 시기는 일제 강점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격동기의 한국 현대사 시기이다. 특히 독자가 숨겨진 정보를 하나하나씩 찾아가게 하는 추리 소설적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서술의 긴장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작가는 오일규와 김기범이라는 무사형과 악사형의 두 인물을 내세워 이 시대에 서로 다른 두 지식인의 상을 보여 주며, 바람직한 인간형이 과연 어떤 유형인지에 관해 진지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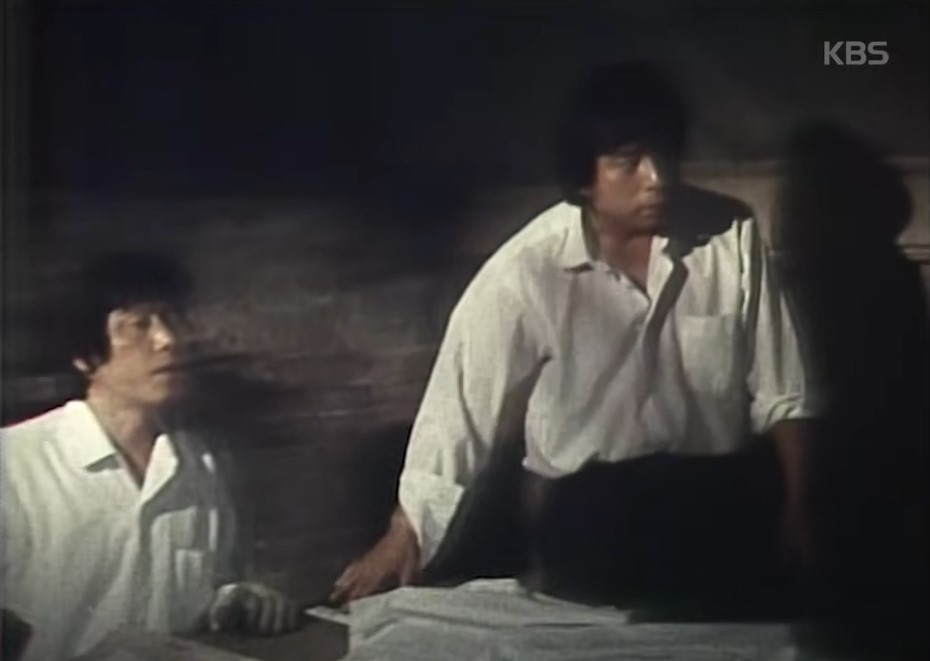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소학교 때부터 '나'(정동근)의 친구인 김기범은 영민한 두뇌의 소유자이자 배신의 명수이다. 그러나 그의 배신은 전혀 밉지 않다.
일본 유학 시절 학도병으로 끌려가는 조선인 학생들을 위한 출정식인 장행회(壯行會)에서 '조선 만세'를 부르자는 거사를 계획한 일이 있었다. 그때 김기범은 조선 만세, 일본 만세, 대동아 만세를 모두 부름으로써 거사를 계획한 동지들의 체면을 살리면서 그들의 감옥행을 막아 주었다. 또, 해방 후에는 신문 기자로서 친일 행위자를 옹호하는 기사를 썼다가 테러당하기도 했는데, 그의 주장은 그들이 반민족적 행각을 하면서 마음의 고통이 심했을 것이니 인정상 무자비한 처단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그의 유연한 성격은 아내의 불륜까지도 너그럽게 숨겨 줄 정도로 파격적이었다.
어느 날,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얻고 있던 오일규가 교통사고로 죽는다. 오일규가 정치적 야심에 불타 민의원에 출마했을 때, 김기범은 그의 조직원으로 맹활약하다가 상대방 후보에게 매수되어 그를 배반하게 된다. 이 일로 오일규는 김기범과 절교(絶交)했던 사이였다. 그런데 지금 그의 장례식에 나타난 김기범은 다음과 같이 넋두리를 늘어놓는다.
“일규는 세상이 편안할 때면 칼을 뽑는 운 좋은 무사이고 나는 그 무사를 칭송하면서 살아가는 악사였다. 무사님들이 모순에 찬 작업을 할 때, 악사들은 뒷전에서 ‘옳소!’ 소리나 하면서 배고프지 않게 살면 그것이 우리의 사는 즐거움이다. 그래서 무사와 악사는 서로 경멸하면서도 사이좋게 살아가는 법이다.”
그 후 김기범 역시 돌연 자취를 감춘다. 그는 변성명을 한 채 시골에 들어가 도인(道人)의 삶을 산다. 십 년 후 김기범 역시 교통사고로 사망한다.

이 소설은 격동의 역사 속에서 용기 없는 태도로, 살아남기에만 급급했던 지식인의 부정적 모습을 그리고 있다. 주인공 김기범의 기이하고도 모순된 행적은 바로 우리 사회 지식인의 부정적 존재 양상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삶의 방식이 옳은가 그른가를 반성케 하는 거울이다.
일본 유학 시절, 학도병 장행회장(壯行會場)에서 김기범이 보여 준 현실 판단과 그에 따른 기민한 대처 그리고 해방 후 반민족적 친일 행위자의 인간적 약점에 대한 포용력과 유연성, 또 오일규에 대한 협력과 배반의 재주….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주인공이 돈키호테 같은 인물이면서도 현실에 대한 재빠른 판단력을 소유한 인물, 곧 모순성을 내포한 인물임을 보여 준다. 이에 반하여 오일규는 이른바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갖춘 인물로서 김기범과는 상대적 관계에 있다.
♣
작가는 이 두 인물을 무사(武士)와 악사(樂士)에 비유함으로써 그들의 삶 즉, 이 사회 지식인의 삶을 희화화(戱畵化)하고 있다. 세상이 혼탁할 때는 나타나지 않다가 편안할 때만 칼을 뽑아 정의로운 도덕적 인물로서 명성과 지위를 얻는 편(오일규)은 무사(武士)이고, 그러한 무사의 행위들을 다만 칭송함으로써 배고프지 않게 살아가는 편(김기범)은 악사(樂士)이다.
무사와 악사는 서로를 경멸하면서도 불가분의 관계로 맺어져 있다. 그러기에 무사가 현실이라는 무대에서 사라지면 악사도 사라져야 할 운명이다. 오일규의 죽음으로 김기범도 사라지듯이, 여기에서는 소위 '의의 있는 삶'이란 설 자리가 없다. 작가는 김기범의 기이하고도 모순된 행적을 통해 '의의 있는 삶'이 아닌, '배고프지 않은 삶'의 추구에 급급한 지식인의 삶을 깨우쳐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