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택 단편소설 『화수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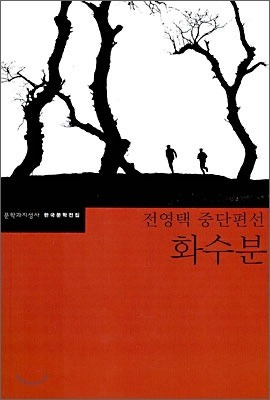
소설가·목사 전영택(田榮澤.1894∼1968)의 단편소설로 1925년 [조선문단]에 발표되었다. 1920년대의 궁핍한 사회 현실을 묘사하고 있다. 또한 일제의 가혹한 수탈로 당대 사회의 참혹한 궁핍상을 담담하게 형상화하였다.
가난한 부부의 삶의 실상을 통해 당대 시대적 상황과, 이를 극복하려는 인도주의적 작가 의식을 투영하고 있는 점에서 1920년대 자연주의 소설의 한 전범을 보여 주는 작품이기도 하다. 이 작품은 죽음으로 이어지는 빈곤이 생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조건임을 전제로 한 비극적인 삶의 모습을 포착하고 있다. 사회적 빈궁에 항거하는 이념성이 내포되어 있지 않은 반면, 작가만의 인도주의가 흐르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은 냉혹한 관찰을 통해 한 선량한 가족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는 대목은 1920년대 우리나라 문학의 한 성과로 보인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나는 어느 초겨울 추운 밤 행랑아범 화수분의 흐느끼는 소리를 듣는다. 그해 가을에 아범은 아내와 어린 계집애 둘을 데리고 행랑채에 들었었다. 아홉 살 난 큰애를 굶기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어멈이 어느 연줄을 통해 강화로 보내 버렸다는 말을 듣고 아비는 슬피 우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화수분은 형이 발을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추수하러 고향인 양평으로 간다. 시골로 가서 형 대신 일을 심하게 한다. 그는 과로가 겹쳐 몸져눕게 된다. 열이 펄펄 끓게 되어 아주 정신없이 앓는다. 그리고 강화로 보낸 딸 이름을 수없이 부르며 슬퍼한다.
한편, 어멈은 남편이 쌀 말이라도 해서 올 것을 기다렸으나, 추운 겨울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자 어린것을 업고 남편을 찾아 길을 떠난다. 마침 화수분도 어멈의 편지를 받고 아내와 딸을 데려와서 굶어도 같이 굶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형 집안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길을 떠나 서울로 향한다. 날씨는 살을 에는 추위였다. 백 리를 걸어서 해가 질 무렵이 되었을 때 화수분은 어떤 높은 고개의 소나무 밑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희끄무레한 물체를 발견한다. 어멈과 딸 옥분이었다. 어멈은 눈을 떴으나 말을 못했다.
이튿날 아침 나무장수가 지나가다가 그 고개에서 화수분과 그의 아내가 서로 껴안은 채 얼어 죽은 것을 발견했다. 그 가운데 막 자다 깬 어린애가 등에 따뜻한 햇볕을 받고 아직 살아 있었다. 두 사람의 따뜻한 체온이 어린것을 감싸 준 것이다. 나무장수는 그가 몰고 가던 황소의 등이에 어린것만 싣고 떠나 버린다.

화수분은 원래 일종의 보물단지로 그 단지 안에 온갖 물건을 넣어두기만 하면 새끼를 쳐서 끝없이 자꾸 나온다는 단지인데, 일반적으로는 재물이 자꾸 생겨 아무리 써도 줄지 않는 현상이나 그렇게 돈을 잘 벌어 오는 사람, 또는 수입을 늘려 주는 가게나 기구를 칭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속담에 ‘화수분을 얻었나?’라는 것은 재물을 물 쓰듯이 하는 사람을 탓하는 말이요, ‘화수분을 얻었다.’고 하는 속담은 큰 보물이 생겼다, 큰 횡재를 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화수분은 행운을 주는 일종의 주보(呪寶)인데, 대체로 화로, 절구, 돈을 누는 당나귀, 동전, 사람의 비밀을 다 알려 주는 거울 등으로 나타난다. 화수분의 분(盆)을 볼 때 오목한 기구인 화로나 절구가 제격이라 할 것이다.
옛날 어떤 사람이 패가(敗家)를 하고 나서 객지에 나갔다가 산골 조그만 집에서 노친들을 잘 봉양하여 화로 하나를 보답으로 받았다. 그 화로에 불을 담으면 불이 계속 나오고 쌀을 담으면 쌀이 가득 나오고, 수수·콩 무엇이든지 넣는 대로 계속 나와 결국 이 사람은 부자가 되었다 한다.
♣
이 작품은 궁핍한 환경 속에서 굶주리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화수분 일가의 가족 비극을 차분한 필치로 그려나가는 전영택의 대표작이다. 극빈과 비참한 생활이라는 소재였음에도 작자 스스로의 느낌을 강요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인간의 원시적인 온정을 불러일으킨다.‘화수분’이란 이름은 ‘재물이 계속 나오는 보물단지’라는 뜻이지만, 이 작품에서는 찢어지게 가난한 주인공을 가리킨다. 즉, ‘화수분’은 반어적 명명법에 의해 붙여진 주인공의 이름인 것이다. 이러한 반어가 이 작품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이 작품의 진정한 주인공은 ‘가난’이라 할 수 있다. 자식을 남에게 주어야 할 정도로 궁핍한 삶, 또 그래서 남의 손에 넘어가는 자식의 반응, 이 때문에 심한 갈등을 느끼는 회수분 내외, 이 모든 정황이 소설의 주제와 구조를 이루는 요소이다.
참으로 비참한 생활이다. 왜 이렇게 가난하게 되었을까? 김동인의 <감자>에서는 남편이 게을러서 가난하게 되었는데, 화수분 내외는 그렇지도 않다. 게을러서가 아니라 일거리가 없어서 굶는 것이다. 일제 식민지하의 우리 민족의 삶이 바로 이러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작가는 그 원인을 찾고 비판하기보다는 어려운 처지에서도 인정을 지닌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화수분이나 그 아내나 마음씨가 곱고 겸손한 사람들이다. 너무나 가난한 나머지 큰딸을 남에게 주고 밤새도록 섧게 우는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특히 추운 겨울에 길가에서 부부가 서로 껴안고 죽어가는 마지막 장면은 비극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진한 감동을 안겨준다.
'한국 현대소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영택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전야의 풍경』 (0) | 2015.12.22 |
|---|---|
| 이병주 단편소설 『예낭 풍물지』 (0) | 2015.12.17 |
| 황석영 연작동화집 『모랫말 아이들』 (0) | 2015.12.02 |
| 채만식 장편소설 『태평천하』 (0) | 2015.11.26 |
| 주요섭 단편소설 『사랑손님과 어머니』 (0) | 2015.11.18 |



